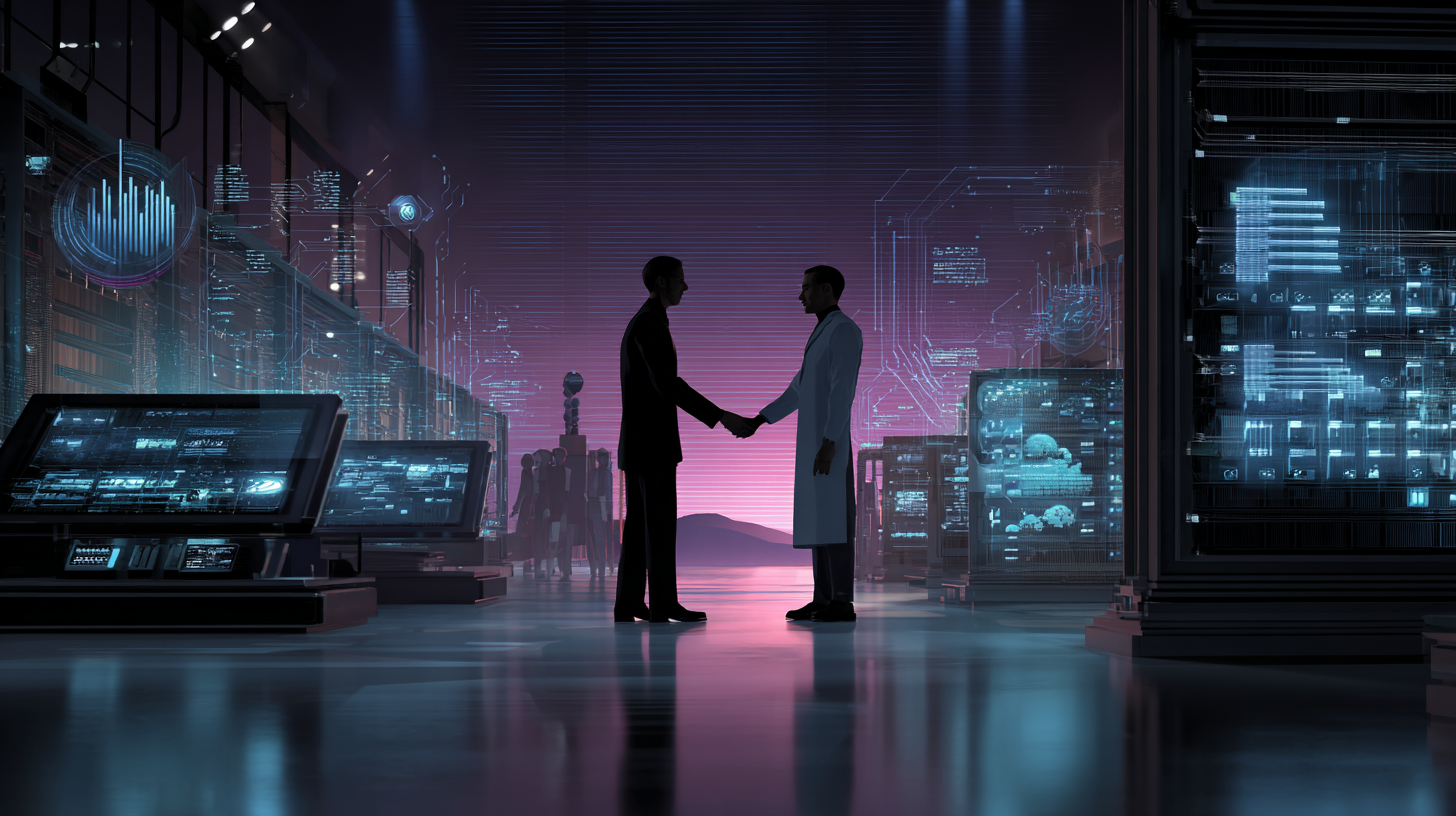스레드, 광고판 준비는 됐고, 이용자는?
메타의 스레드(Threads)가 광고 플랫폼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한국 사용자들의 반응도 복잡해졌다. 관계 기반 수용, 동영상 광고 피로, 그리고 프라이버시 경계까지. 메타의 전략과 사용자 심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살펴본다.

스레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생각났다. 깔끔해서다. 왜 깔끔하지? 아, 아직 광고가 없으니까!
메시지 중심 소셜미디어로 조용히 출발한 스레드가 그 조용함을 깨고 슬그머니 광고를 들이밀고 있다. 한국은 1차 광고국에서 제외되어 아직 대놓고 광고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험적 광고가 집행 중이다.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니까 광고는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광고가 노출되면 반응은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 관건은 하나 '콘텐트처럼 보이는 광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2025년 4월, 메타 코리아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용자 중 58%는 “내가 팔로우 중인 브랜드의 이미지 광고는 자연스럽다”고 답했다. 이건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관계가 있는 광고는 받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광고도 결국 맥락과 신뢰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 광고로 넘어오면 분위기는 싸늘해진다. 같은 조사에서 72%는 “5초 넘는 영상 광고가 도입되면 앱 사용을 줄이겠다”고 대답했다. 예고 없이 등장하는 영상 광고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 요즘 말로 이용자 경험을 해치는 - 가장 빠른 방법이다. 특히 초단편 콘텐츠에 익숙해진 사용자에게 긴 광고는 갑자기 튀어나온 장애물이다.
광고 형식이 자연스럽고 문화적으로 연결될 때는 이용자 반응이 확실히 달라진다. 메타는 최근 방탄소년단 공식 계정과 협업해 숏폼 광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5초 길이의 세로형 영상에 QR코드를 삽입해 티켓 예매 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특히 Z세대에게 익숙하고, ‘광고’라기보다 ‘정보’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타겟 광고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사용자 불쾌감도 함께 증가하는 게 현실이다. 메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7월 중 가상번호 기반의 암호화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역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유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든, 이용자는 '누가 보냈고, 왜 나한테 이게 왔는가'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AI 기반의 '맥락 광고'다. 메타는 2026년까지 한국어 자연어 처리(NLP)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단순히 키워드만 보고 광고를 노출하는 시대는 이제 끝.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맥락, 위치 정보, 선호도 등을 종합해 ‘정말 관련 있는 광고’만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또한 메타는 광고 수익 공유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일부 사용자 및 크리에이터가 광고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 광고를 보는 것도, 추천하는 것도 플랫폼 참여로 간주되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다. 이는 광고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만들겠다는 시도다.
결국, 스레드가 광고 플랫폼으로 안착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광고가 사용자의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해야 한다.
둘째, 특히 영상 광고는 첫 3초 안에 핵심을 전달하고 부담 없이 사라져야 한다.
셋째, 창작자–이용자–광고주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2025년 지금, 한국의 스레드 이용자는 광고를 무조건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대충 만든 광고, 거슬리는 광고, 아무 상관없는 광고, 불쑥 튀어나오는 광고를 싫어할 뿐이다. 광고가 콘텐트처럼 대접받고 싶다면 콘텐트처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말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뿐이다. 로그아웃은 늘 조용한 법이니까.